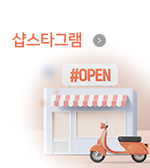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23.08.27 15:46:20
- 최종수정2023.08.27 15:46:20

신현애
수필가·공인중개사
지난 5월, 햇빛은 생선의 비늘처럼 빛나고 있고, 아파트 담장에는 넝쿨장미가 탐스럽게 피어있을 때 나는 지옥문 앞까지 갔다 왔다. 약 처방을 받으면 2주일, 그냥 있어도 보름이라는 감기를 한 달 가까이 껴안고 있었다. 예전의 젊은 날처럼 쉽게 생각했고, 또 계절 탓도 있어 나아지는가 싶어 시원한 과일을 먹으면 또다시 잔기침으로 이어졌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고삭부리가 된 신체에 마음은 무너졌다. 기운이 쇠잔해져 자꾸 자리에 눕고 싶고, 바닥이 어딘 줄도 모르게 정신은 까무룩 하게 꺼져가는 듯했다. 지나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람과의 정을 붙이려고 오지랖을 펼쳤던 일과 시간을 금쪽처럼 아끼며 살아온 날들이 모두 여들 없게 느껴졌다.
태생적으로 야물지 못한 체질인 나는 후천적으로도 체력단련을 위한 노력이나 운동을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최장수 왕이었던 영조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건강염려증이 있었던 걸까. 궁궐 안에 있는 내의원에서 사흘에 한 번씩 재위 기간 52년 동안 무려 7천 번 정도 진찰을 했다고 한다. 자기관리가 투철한 정신은 현대인들도 흉내 내지 못할 만큼 철저했는데, 그래서인지 66세에 51세나 어린 왕비를 맞아들였고 칠십이 넘은 나이에 검은 머리가 다시 나오고 팔십이 넘어서는 치아가 새로 나왔다고 실록에 나온다.
'엎친 데 덮친다.' 나쁜 일은 겹치어 일어난다더니 꼭 그 격 이었다. 아파트 이웃 동에 사는 딸아이 내외가 코로나 진단을 받았다. 역병의 기세가 조금 수그러들었을 때였지만, 이제 백일이 지난 아기가 함께 있어야 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간식을 갖고 위로라도 하려고 찾아갔지만, 현관문을 배꼼 하게 열어본 딸은 거리를 두고 말했고 면역력이 약한 나 또한 조심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다 울고 말았다. 이때 미욱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격리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긍휼히 여긴 신의 가호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천만다행한 것은 아기가 건강하다는 사실이었다.
아픈 만큼 성숙한 것일까. 두어 달 감기로 시작한 몸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깔밋하게 살아오지 못한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삶의 방향도 그려 보았다. 건강의 소용돌이가 끝난 어느 날 아침, 그렇게 찾아 헤맸던 채변 통은 컴퓨터 책꽂이 옆에 있었다.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가을철 앞두고 충북지역서 '벌 쏘임·뱀 물림' 피해 잇따라
[충북일보] 가을을 앞두고 충북지역에서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벌 쏘임 신고 건수는 이날까지 총 27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최근 3년간(2020~2022년)벌 쏘임 신고 건수는 △2020년 493건 △2021년 497건 △2022년 456건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1일 오후 1시 59분께 제천시 수산면에서 등산을 하던 40대 여성이 벌에 쏘이는 사고를 당했다. 앞서 14일 오후 7시 34분께에는 영동군 황간면에선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벌 쏘임 사고가 급증하는 원인은 기온상승과 습한 기후로 인해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개체군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말벌류의 생애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등 화장품 자제해야 하고 소매가 긴 옷을 입어 팔, 다리 노출을 최소화해야한다.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 머리부위를 감싸고 자체를 낮춰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벌침을 제거하거나 쏘인 부위를 깨끗한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오송국제학교 설립 준비 본격화…연구용역 착수
[충북일보]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다. 학교 설립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4월까지 운영 주체와 조성 부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오송국제학교(가칭)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가 23일 열린다. 이 자리에는 충북경자청과 청주시, 충북교육청 등의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용역 수행 계획과 과업 수행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8개월 동안 진행되며 2024년 4월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국내·외 글로벌 교육 환경과 국제학교 운영 실태, 입학 수요 등을 살펴본 뒤 설립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유치 가능한 외국 학교법인을 제안하고 이들 법인의 오송 유치 당위성과 타당성 근거를 제시한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영국에서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4곳이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교 부지는 오송 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이나 개발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충북경자청은 민간 사업자도 유치 중이다. 경자구역에 국제학교 설립 시 국비를 지원받기
실시간 댓글
- 충주 이한출님과 천윤옥님의 모듬 쌈채소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한출쌈채소"를 검색해주세요.
- 충주 이한출님의 모듬 쌈채소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이한출쌈채소"를 검색해주세요.
- 산책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자전거도로를 이용할수 밖에 없을때도 있다. 비만오면 산책로는 물도 안빠지고 진흙길도 바뀌는 곳이 여러곳 있다. 제대로 관리하고 이야기하자!
- 정정보도 요청합니다. 기사 내용 중 '윤철원 세종문화원 부원장도 미호강 명칭 변경에 찬성 의견을 냈다.'는 오보입니다. 윤철원은 미호강 명칭을 찬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진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토론을 했습니다. 따라서 ' 윤철원 세종문화원 부원장도 동진강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보도 요청자 윤철원
- 피해복구에 힘써주시는 주무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전국동시 요한 계시록을 설교 한다니 놀랍군요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봐야겠어요
- 전국동시에 한다니 대단해요 .관심이 많다는 것이니까요
-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
-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자격), Royal 서강대(세계사의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매거진 in 충북

충북기업 돋보기 7.이덕형 ㈜ALT 대표이사
[충북일보]"반도체 시장의 성장 속에서 선제적 기술 개발로 비메모리 후공정 분야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AI, 로봇, 빅데이터,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먹거리 혁신 산업 성장에는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필연적을 따른다. 반도체 생산공정 중 '후공정'은 전공정을 통해 생산된 웨이퍼를 테스트하고 사용될 전자 기기에 적합한 형태로 패키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충북 청주 오창산단에 소재한 ㈜ALT(에이엘티)는 20년의 업력을 지닌 OSAT(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사업 기반 다양한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이다. 지난 7월 27일 코스닥 상장을 마쳤다. 에이엘티는 웨이퍼 상태에서 △양품과 불량품을 가려내는 웨이퍼 테스트 △웨이퍼 절단·양품 재배열 과정인 Dicing·P&P △자회사 ㈜에이지피가 실시하는 패키징 △최종 패키징이 완료된 개별칩에 대한 파이널 테스트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테스트 제품군의 포트폴리오는 △DDI △CIS △PM-IC(IGBT 등) △MCU/SoC 등으로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이 가능하다. 에이엘티의 차별화된 기술력중 '림컷(Rim cut)'은 독보적인 기술이다. 고전력 반도체 초박막 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