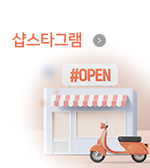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23.06.18 16:20:48
- 최종수정2023.06.18 16:20:48

이정희
수필가
종종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럴 때마다 책임을 질 수 없으니 고심 끝에 써 붙인 안내문이다. 같은 뜻이지만 하나는 만약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을 거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분실되는 일이 많으니 조심해 줄 것을 부탁하는 말이다. 식당을 다니면서 두 가지 문구를 수차례 보았으나 성공과 실패의 조건으로 분석할 줄이야.
상황이 그려진다. 맛있게 밥 잘 먹고 나가려는데 신발이 없어졌다. 황당할 수밖에. 누군가, 메이커 신발을 신고 온 손님이 식사할 동안 욕심이 나서 바꿔 신었을 거다. 당연히 실랑이가 벌어졌으리. 그런 일이 한 두 번은 아니겠지만 책임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는 것은 좀 그렇다. 경위야 어쨌든 식당에서 생긴 일인데 전혀 몰라라 하는 것은 글쎄? 변상은 어려워도 도덕적 책임은 있지 않을까. 같은 말이어도 아 다르고 어 달랐던 것을.
한두 번 아니게 옥신각신하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써 붙였겠지. 그렇더라도 '신발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라며 도덕적 책임은 지겠다는 거라야 맞다.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손님에게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 보셨잖습니까"라고만 하는 주인과 어쨌든 죄송하다는 주인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끌릴지 상상이 간다. 책임질 수 없다고는 했어도 송구스러운 자세로 나오면 '그래, 주인 잘못일 수는 없지' 라고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지인 중 한 사람도 랜드로바 구두를 신고 갔다가 잃어버렸다. 그러나 몇 번 실랑이 끝에 흐지부지되었다고 한다. 주인의 잘못은 없겠다 싶어 그냥 나온 거지만 깐깐한 손님과 사단이 났을 것이다. 문제의 손님은 손해를 따지기보다 붙여 둔 문구만 앞세워 전혀 몰라라하는 것이 못마땅했겠다. 탐을 내서 바꿔 신을 정도면 꽤나 고급일 테고 물어 주기는 힘들어도 난처한 입장을 밝히면 수긍했을 것이다.
친구와 함께 외식을 하던 날이었다. 자판기 옆에 '커피와 음료는 셀프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 딱히 그게 아니어도 식사가 끝나면 후식으로 으레 커피를 뽑아와 먹는데 그 날 따라 주인 여자가 쟁반에 직접 담아 왔다. 바쁜데 뭘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더니, 지금은 한 숨 돌릴 시간이라면서 웃는다.
실제 홀 안의 손님은 거의 빠진 뒤였다. 종업원들은 담소를 나누는 중이었고 비로소 커피나마 담아 올 수 있었던 거다. 바쁠 때는 몰라도 한갓질 때 못 본 체하는 건 손님 입장에서도 거북하다. 직접 챙겨 먹을지언정 미처 돌아보지 못한 입장을 해명한다면 누군들 이해하지 않을까.
성공적 운영 요건이라면 맛있는 음식과 쾌적한 실내 공간 등 여러 가지였으나 가끔은 사소한 일 하나가 영향을 끼친다. 단지 통계자료일 뿐 흔한 신발장과 자판기의 문구가 무에 차질을 줄까마는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식당에서 불쾌감을 조성하는 건 맛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도덕성에도 어긋난다.
셀프라고 공공연 선포한 것과는 달리 쟁반에 담아 온 것은 분명 남다르다. 생각하니 늘 손님으로 붐볐다. 주인과 종업원 모두 싹싹한 건 물론 음식도 맛깔스럽다. 손님의 입장을 헤아리며 더 좋은 식재료 구입과 합리적인 조리법 개선으로 손님의 기호를 맞춰주면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본다.
최선을 다한들 불경기에는 속수무책이나 그 외에는 성실하게 일한 만큼의 결과가 나온다. 그렇지 못한 식당의 타박보다는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고 헤아릴 동안 뜻한 바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을 말하고 싶다. 성공도 실패도 자기 품성이었던 것이다.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청주시 명암관망탑,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조성
어린이 특화공간의 세부 구성요소는 과학문화 전시실과 VR 체험관 등 놀이형 과학문화체험관, K만화 및 웹툰, 생태특화박물관 등으로 꼽혔다. 청년 F&B 창업공간에는 로컬 맥주·공동양조장·외식업 시설이 들어서고, 1층 옥상에는 하늘 정원과 수상레저 체험시설 등 여가 및 레포츠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활용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이 즐겨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명암관망탑은 지난 2003년 명암저수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졌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20년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은 이달 12일자로 종료됐다. 사업자는 한동안 지하 2층 웨딩홀만 운영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명암관망탑을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미기로 했다. 시는 지난 16일 '명암관망탑 활용방안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명암관망탑에 어린이특화시설, 청년 창업공간, 문화예술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지상 2~13층은 공예비엔날레 등과 연계한 기획 전시실로 활용하고 건물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충북 항공정비 산업 날개 펴다…인프라 조성 착착
[충북일보] 충북도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는 회전익(헬리콥터) 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헬리콥터 정비 등이 중심이 된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가 들어설 청주 에어로폴리스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회전익 정비단지가 둥지를 트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이달에 조성이 완료됐다. 1지구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일원 13만3천㎡로 개발됐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는 헬기 정비업체 2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2019년 10월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들 업체는 착공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충북경자청은 남은 산업용지에 항공정비 등 관련 업체 1곳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이다. 경자구역인 2지구는 40만9천㎡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공정률은 68%이며 2024년 준공이 목표다. 충북경자청은 이주자 택지 조성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곳은 1지구와 연계해 항공정비 산업을 육성할 클러스터로 꾸며진다. 항공정비와 부품제조 기업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관련 업체 18곳이 충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119항공정비실도 건립된다. 지난해 3
실시간 댓글
- 10월29일, 광화문 집회 경과.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 종료, 행진 . 5시10분 전후, 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오후 5시, 시작 . 6시30분, 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서울역,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 10월29일, 광화문 집회 경과.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 종료, 행진 . 5시10분 전후, 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오후 5시, 시작 . 6시30분, 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서울역,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 10월29일, 광화문 집회 경과.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 종료, 행진 . 5시10분 전후, 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오후 5시, 시작 . 6시30분, 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서울역,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 10월29일, 광화문 집회 경과.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 종료, 행진 . 5시10분 전후, 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오후 5시, 시작 . 6시30분, 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서울역,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 몽환적이네요 눈을감고 잠시 생각합니다~^^
-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승계로, 6백년 넘는 역사를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Royal 성균관대.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두 대학만 일류.명문대임. 해방후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유교국가 조선의 한문성명.본관등록이 의무인, 행정법.관습법상 유교나라 한국. 5,000만 한국인뒤 주권없는 패전국 불교 Monkey 일본의 성씨없는 점쇠(일본에서는 천황). 그뒤 한국에 주권.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점쇠가 세운 마당쇠).
- 이런 데에 헛돈 쓰지말고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하세요.
- 10월29일, 광화문 집회 경과.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 종료, 행진 . 5시10분 전후, 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오후 5시, 시작 . 6시30분, 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서울역,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 10월29일, 광화문 집회 경과.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 종료, 행진 . 5시10분 전후, 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오후 5시, 시작 . 6시30분, 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서울역,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매거진 in 충북

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충북일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 국내 시장에 '콜라겐'이라는 이름 조차 생소하던 시절 장부식(60)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는 콜라겐에 푹 빠져버렸다. 장 대표가 처음 콜라겐을 접하게 된 건 첫 직장이었던 경기화학의 신사업 파견을 통해서였다. 국내에 생소한 사업분야였던 만큼 일본의 선진기업에 방문하게 된 장 대표는 콜라겐 제조과정을 보고 '푹 빠져버렸다'고 이야기한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에게 해당 분야의 첨단 기술이자 생명공학이 접목된 콜라겐 기술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분야였다. 회사에 기술 혁신을 위한 보고서를 일주일에 5건 이상 작성할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장 대표는 "당시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일본 기업으로 선진 견학을 갔다. 정작 기술 유출을 우려해 공장 견학만 하루에 한 번 시켜주고 일본어로만 이야기하니 잘 알아듣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견학 때 눈으로 감각적인 치수로 재고 기억해 화장실에 앉아서 그 기억을 다시 복기했다"며 "나갈 때 짐 검사로 뺏길까봐 원문을 모두 쪼개서 가져왔다"고 회상했다. 어렵게 가져온 만큼 성과는 성공적이었다. 견학 다녀온 지 2~3개월만에 기존 한 달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