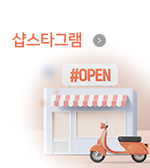최근기사
- 웹출고시간2015.06.21 13:29:02
- 최종수정2015.06.21 13:29:02
정부는 지난 1월 MRO 산업단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충북이 제일 먼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뒤이어 경남이 따라왔다. 충북은 청주국제공항 등 유리한 입지조건을 내세웠다. 경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무기로 유치전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 주 열린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정비산업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장우철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의 발언이 예사롭지 않다. MRO사업 방식의 변화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발언이다.
장 과장은 MRO 조성사업이 청주공항 중심의 민·관 합작형태와 순수 민간사업 등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경남도를 사업파트너로 결정한 것이 되레 충북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엿보게 할 수 있는 발언이다.
충북이 MRO 산업단지 유치전을 벌이는 이유는 명료하다. MRO 수요가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내 MRO 수요는 연간 약 2조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10년 뒤에는 항공산업 성장과 함께 4조2천억 원 수준으로 커질 것이란 예상이 있다.
충북은 MRO사업의 가치를 일찍 파악하고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 게다가 충북은 국토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교통과 물류비용에서 가장 유리하다. 청주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외기업 투자 유치에도 최적의 조건이다.
그러나 가장 경계하는 건 여전히 충북의 정치력 부재를 노린 정치적 선택이다. 지난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남 사천이 MRO 단지의 최적지"라고 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 게다가 이번 충북이 개최한 토론회에도 김 대표는 참석치 않았다. 김 대표는 대권을 꿈꾸는 인물이다. 오해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삼가는 게 좋다. 자칫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충북은 이미 지난해 1월 아시아나항공과 협약을 체결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들도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 상태다. MRO사업 방식에 변화가 생기든 안 생기든 MRO단지는 충북 청주로 와야 한다. 그게 국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Hot & Why & Only
-
Hot

청주시 악성 민원인 '확' 줄었어도 "악"
[충북일보]청주시의 악성 민원인, 이른바 몬스터 민원인이 크게 줄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위험물 소지 방문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의 악성민원인 신고 건수는 96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에 불과했다. 1년 사이 90%가량 급감한 것이다. 올해 역시 1월부터 3월까지 악성민원 신고 건수는 3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악성민원인을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해마다 2차례씩 악성민원인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 16곳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증거확보용으로 영상촬영이 가능한 목걸이형태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했다. 시는 올해 50여대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추가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악성민원인이 발생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됐고,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이 조례에는 비상대응팀 구성과 운영, CCTV·자동녹음 전화 설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노력에 신고 건수 자체
-
Why

충북대서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왜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
Only

청주시 악성 민원인 '확' 줄었어도 "악"
[충북일보]청주시의 악성 민원인, 이른바 몬스터 민원인이 크게 줄었지만 공무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위험물 소지 방문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의 악성민원인 신고 건수는 96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0건에 불과했다. 1년 사이 90%가량 급감한 것이다. 올해 역시 1월부터 3월까지 악성민원 신고 건수는 3건으로 조사됐다. 시는 악성민원인을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시에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로 해마다 2차례씩 악성민원인 대응훈련을 하고 있고, 16곳의 행정복지센터에는 증거확보용으로 영상촬영이 가능한 목걸이형태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했다. 시는 올해 50여대의 웨어러블 카메라를 추가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악성민원인이 발생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됐고, 관련 조례도 제정됐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이 조례에는 비상대응팀 구성과 운영, CCTV·자동녹음 전화 설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노력에 신고 건수 자체
실시간 댓글
- 청주시청 옆에서 컴퓨터 도매상가를 지어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청주시청은 제가 도매상가 지었다 했는 데도 물건 고시 없이 명의 수탁자에게 몰래 등기내라 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저촉되는 등기로 이전받고 철거비용줬는데 철거비용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4항 사업자인 청주시청이 부담하는 것인데 그걸 보상했다고 우기고 있네요 건축법이 달라저 이전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명의 수탁자에게 1억8천 몃백주고 불법등기로 이전받고 저를 쫓아 냈네요
- 청주 병원은 비영리 의료 법인이니 공익을 위한 단체이며 그 주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입니다. 원장님이 공익 의료사업에 투자하신 것이고 재산역시 보건복지부 재산이며 5백 억줘도 공적자금일 뿐입니다. 저분들 생계 때문에 저리하시는 것으로 저분들 모두 질 높고 저렴한 의료비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내과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저분들 몰아내고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 역행하는 상가지역에 시청을 짓는 것은 공익에 해가되는 공해 사업입니다.
- 김다현 가수님 충북교육청 홍보대사 연임을 축하해요 ~ 언제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 청주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데 200억 이상 들었는데 병원은 땅사고 건물짓고 건물짓는 동안 임시거처 만들고 5백억 주세요 주기싫음 다른 장소로 시청 옮기세요 130명에게 피눈물 내고 시장하신다면 정상적인 시장님이라 누가 말하겠습니까.
- 청주 병원은 비영리 의료 법인이니 공익을 위한 단체이며 그 주인은 보건 복지부장관입니다. 원장님이 공익 의료사업에 투자하신 것이고 재산역시 보건복지부 재산이며 5백 억줘도 공적자금일 뿐입니다. 저분들 생계 때문에 저리하시는 것으로 저분들 모두 질 높고 저렴한 의료비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입니다. 내과 원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저분들 몰아내고 맹자의 어머니 생각에 역행하는 상가지역에 시청을 짓는 것은 공익에 해가되는 공해 사업입니다.
- 청주시청 옆에서 컴퓨터 도매상가 660평방 메터를 지은 사람입니다. 시청은 제가 도매상가 지었다 했는 데도 명의 수탁자에게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저촉되는 등기내라 해서 철거 비용주고 제게는 1원도 보상 하지 않았네요 철거비용 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4항 사업자인 청주시청이 부담하는 것인데 그걸 보상했다고 우기고 있네요 도매상가는 건축법이 달라저 이전 설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8억 보상받아야 하는데 1원도 안주고 저를 쫓아 냈네요 주여 130명의 생존권을 지켜주소서
- 강제동원하고 밥값도 떼나 보네. 국방부놈들 진짜 야박하다.
- 정우철이 무소속으로 뛰쳐 나오지 않았으면 박후보가 그래도 해볼만한 선거였는데 좀 아쉽다 투표율도 너무 저조쌨고...
-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지혜로운 판결 대공황이 한참이던 1930년대 어느 겨울 밤, 뉴욕 즉결법정에 어떤 할머니가 서게 되었다. 사위는 실직해 집을 나갔고 딸은 병들어 누워있었다. 할머니는 굶주리는 손녀들을 보다못해 빵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초범인데다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방청객들은 내심 판사의 선처를 기대하였으나 판사는 단호했다.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술렁이는 방청객들의 분위기를 뒤로 하고 판사의 논고는 계속 되었다.
-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뉴욕 시민들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10달러를 모자에 넣고 방청객으로 돌렸다. 금세 57달러 50센트가 모였다. 판사는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47달러 50센트는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었다. 이 판사가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연임한 피오렐로 라과디아이다. 라과디아 시장은 시장 재직 중 비행기 사고로 순직하였다. 뉴욕의 허드슨 강 주변에 공항을 세워 라과디아 공항이라 이름을 짓고 그를 기리고 있다고 한다.
- 지역축제하면 안 돼.. 시민의식이 떨어져서.. 축제 입장하는 곳 만들고 지역축제 전용 쓰레기봉투 만들어서 입장할 때 구매해야지만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 버린다
- 10월29일 , 광화문 집회 경과 .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종료,행진 . 5시10분 전후, 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5시 , 시작 . 6시30분 , 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 서울역 ,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 10월29일 , 광화문 집회 경과 . 남쪽집회 . 노동조합 총력 결의대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2만여명 . 오후 2시 ,시작 . 4시30분 , 종료,행진 . 5시10분 전후,서울역 통과 . 6시30분 전후, 이태원로 도착 . 종료 / 광화문 남쪽집회 . 촛불 승리전환행동 집회 . 미디어 추산 참가인원 , 1만3천여명 . 5시, 시작 . 6시30분,종료 , 행진 . 7시 30분 전후 , 서울역 , 남영역 통과 . 한강대로 . 8시 30분 전후 , 이태원로 도착 ( 맨 후미 , 남영역 인근 통과 ) . 종료 .관제 cctv.
- 종로구 광화문 앞 국민대회와, 유튜브 검색 결과에 나와있는, 용산구 청사 인근의 집회인, 연합예배 국민대회는 서로 다른 집회입니다 ( 주최하시는 분 등 ).
매거진 in 충북

생거진천 '철인군수' 송기섭 진천군수 취임 7주년
[충북일보] ◇진천군을 이끌어 온 지 7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는. 내 고향 진천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 러시아-우크라 전쟁 등 연속적인 위기 속에서 주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내기 위해 끝없는 고민의 시간을 보내온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 도시 체질 바꾸는 데 집중했고 9만 진천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며 한 걸음씩 내딛다보니 철도와 인구·경제의 기적이라는 기분 좋은 타이틀을 얻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재임기간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2015년, 첫 보궐선거에 나서기 전 진천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철도건설을 주장했었다. 당시에는 '황당하다', '현혹한다', '허무맹랑하다' 등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정말 많았다. 하지만 국토부 재직 시절부터 진천군의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항상 가슴 한구석에 품고 있었고 실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철도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