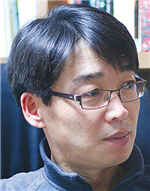
에세이스트

[충북일보] 충북지역 단체장들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비상상황 대응태세에 나섰다. 충북도에 따르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예정된 언론사 인터뷰를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돌발상황과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다. 다만 오후 일정은 그대로 소화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오후 3시 도내 한화그룹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화된 경제불황 문제와 경기침체 상황을 겪고 있는 대기업의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나온 후 김영환 지사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회의를 마친 뒤 오후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오후 1시에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윤 교육감 주재로 도교육청 204호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윤 교육감은 이날 계획된 일정 중 일부를 취소하고 집무실에서 탄핵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당초 윤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스포츠센터를 찾아 54회 충북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참가선수단 격려할 예정이었다. 오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오는 2026년 2월 실시 예정인 전국 신협 개별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 차원에서 불법선거 근절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협중앙회와 충북본부에 따르면 내년 2월 치러지는 신협별 이사장 선거는 오는 2029년 예정된 전국동시신협이사장 선거를 앞둔 마지막 개별 이사장 선거다. 충북도내의 경우 80여개 신협 중 40여개 신협의 이사장 임기가 내년 2월 중 만료된다. 이중 다수 후보자가 등록하는 신협은 경선을 치르게 돼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열한 선거가 전망되면서 투표수 확보를 위한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대납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신협 관계자 A씨는 "최근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는 모집책을 통해 가입한 경우 또는 출자금 대납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했다는 이들의 제보가 늘고 있다"며 "먼저 가입 후 통장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입금하는 방식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1인 1 투표제다. 다만 조합원 자격 유

[충북일보] 이영석(60) 충북예총 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영석 신임 충북예총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는 만큼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영석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예술인의 권익과 위상 정립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미래기반 구축 △충북예술의 글로벌 강화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비전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어느 한 가지부터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져야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예총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뿌리 찾기 일환으로 70년사를 발간하고, 원로 예술인의 발자취를 후배예술인들이 바라보며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격인 충북예술원을 설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악한 충북예총 재정현황 개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자생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원금만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지자체 위탁사업 등을 통해 수익사업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시대속에 순수예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