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5년 6월 9일 원주시 단구동 박경리씨의 집필실에서.
ⓒ박건환‘토지’ 집필을 끝내고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를 출간한 직후다. 당시 필자는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이면서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서 박경리씨나 그의 숱한 저서들을 ‘이상’으로 삼고 있던 시절이었다.
청주에서 원주로 전화를 걸었다. 기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선생님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는 생각과 하기 어렵다는 그와의 인터뷰를 꼭 해내 지역신문의 한계를 극복해보리라는 당찬 욕심에서 계획한 여정이었다. 예상했던 것처럼 그는 거절했다. 그럼에도, 대책 없이 이튿날 사진기자를 대동하고 출발해버렸다.
원주시내에서 길을 물어물어 지금의 토지문학공원이 된 단구동 집필실 대문을 두드렸다. 설마 먼 청주에서 왔는데 문을 안 열어 주지는 않겠지 하는 오만한 생각에서 주저 없이 초인종을 눌렀다. “힘들어서 쉬고 싶다. 그러니 다음에 오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떨렸다.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의 목소리가, 쟁쟁하고 꼿꼿하고 힘찰 줄만 알았는데, 지치고 떨리는 노인의 음성이었다.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문에서 떨어져 나와 돌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느라 대문 앞 논둑길에 마냥 주저앉아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밀짚모자를 쓴 박경리씨가 집안의 현관문을 열고 나와 고추가 심어져 있는 텃밭에서 고양이들을 부르고 있었다. 집 마당 텃밭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철 대문에 다가가 선생님을 다시 한번 부르자 “아니 여태 돌아가지 않았어요?”하고 묻는 것이다.
“제가 대책 없이 온 것을 반성하고 있느라고요.”
“아이구, 무슨 얘기를 듣겠다고 더운데 그 고생을 하는지.”
그는 다가와 굳게 닫혔던 철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렇게 그를 만났다.
우리는 함께 마당에서 고양이 밥을 마저 주었다. 고양이가 여러 마리였는데 주변을 배회하는 들고양이들 이었다. 한번 밥을 주기 시작했더니 매일 집 주변을 배회해 밥을 안줄 수가 없다고 했다.
집필실 안에는 책들이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 ‘토지’집필을 끝내고 조금 한가해진 틈에 보지 않는 책들을 정리해 연세대 원주캠퍼스에 보내기 위해 정리하는 중이라고 했다. 들을 수 있는 분량만큼씩 노끈으로 묶어 한쪽에 쌓아 두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질문하기위해 메모해간 이야기들을 물었고 그가 조근조근 대답해 주었다. 고추를 키우는 일상적인 이야기에서부터 작품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다. 기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그의 심정을 고백하는 말이었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을 다 만났으면 ‘토지’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집필을 끝낸지 일년도 채 안됐는데 좀 쉬고 싶다’라는 말이다. 필자의 분별없는 행위에 정곡을 찌르는 말이었다.
청주로 돌아오는 내내 부끄러워 파란 하늘마저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다. 적어도 집필을 위해 칩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작가들이나 집필을 끝내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작가들을 잠시 기다려 주는 예의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작품을 생산하는 것도 뼈지름을 짜내는 일만큼 고통스러운데 주변의 지나친 관심으로 오히려 창작을 방해받는다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통을 만분의 일쯤이나 짐작할 뿐이다.
오월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세상이 온통 어린이들을 사랑하자는 한목소리를 내는 지난 5일, 그가 고인이 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날아 왔다. 지난해 발병한 폐종양이 원인이라지만, 그 폐종양이 생기는데 지난날 필자같이 분별없는 사람들의 행동이 일조하지 않았을까, 죄책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만큼 나이를 먹어버렸지만 아직도 그를 인생의 목표로 설정해 놓고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이다. 그가 고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동안 필자는 물론이고 한국 문단의 좌표를 흔들 만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허전하고 쓸쓸하게 만들 것이다. 그만큼 그의 존재는 한국 문단에서 가장 우뚝한 영역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가 남긴 무수한 업적을 이루 열거할 수 없는 일들이나, 문학을 지망하는 수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속에 그의 올곧은 정신이 이상이 되어 있을 것이나, 그가 떠나 허허로우면서도 그의 위치가 부럽다는 욕심이 드는 이유다.
그의 육제는 고향인 통영에 묻힌다. 정부에서는 그의 업적을 기려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국민들이 대대손손 그의 작품을 읽어 정신적인 토양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문학정책을 ‘추서’해 주기를 고대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정애 문화담당 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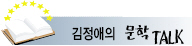
1995년 유월, 초록이 산천을 짙푸르게 물들이고 초여름 햇살이 사방으로 쏟아져 눈조차 바로 뜰 수 없는 계절이었다. 집필 26년 만에 5부 16권의 대하소설 ‘토지’를 완성한 박경리씨, 그를 만나기 위해 나선 날이다.
‘토지’ 집필을 끝내고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들에게’를 출간한 직후다. 당시 필자는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이이면서 신문사 문화부 기자로서 박경리씨나 그의 숱한 저서들을 ‘이상’으로 삼고 있던 시절이었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