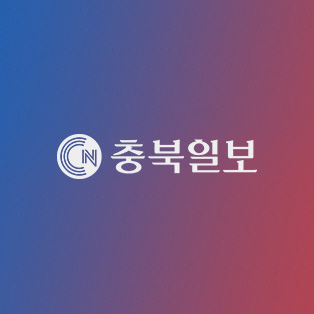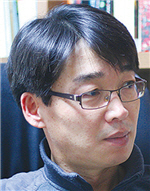
장정환
에세이스트
세상과 이별한다는 속리(俗離), 그 단어만으로도 이 길은 철학과 문학의 풍취가 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았건만(道不遠人) 사람이 도를 멀리하고(人遠道), 산은 속세를 떠나지 않았건만(山非離俗) 속세가 산을 떠난 것이다(俗離山)."
이 시를 남겨야 했던 통일신라시대 고운 최치원의 연유를 잠시 헤아린다.
법주사에서 조금 걷다보니 고목의 짙푸른 그늘아래 포말로 부서지는 계곡물과 마주친다. 높고 깊은 봉우리에서 내달리는 물줄기는 조신하지 않고 소란스레 들떠있다.
오랫동안 목말랐던 대지는 어젯밤 품었던 거친 장맛비가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정인(情人)인양 달뜬 설렘을 감추지 못한다. 아직껏 길과 나무는 촉촉하게 젖어있고 대기는 후끈하다.
이 길은 작년부터 '세조길'로 불린다.
후세의 사람들이 정2품의 벼슬을 받은 소나무까지 기리게 한 세조이지만, 겨우 12살의 어린조카를 죽게 한 비정함에 '참회길'로도 부르는 이 길이 무람하다.
늙어서 이 길을 걸으며 참회했다고 하나 어린 단종이 느꼈을 두려움과 비통함에 어찌 견줄 수 있을까 싶다.
단종이 갇혀있던 작은 섬, 영월 청령포 솔숲은 깊었고 강가의 백사장은 고적했다. 그 곳을 걷는 내내 쓸쓸했던 기억과 겹쳐지니 내겐 그 참회가 부질없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강물이 불어 청령포가 물에 잠길 때 어린 단종이 겪어야 했던 생의 모진 운명이 내겐 버거웠다.
미움과 가책도 없는 삶은 불가능한 것일까· 서로에게 죽음과 절망과 슬픔을 겨누지 않고, 생생한 삶의 긍정을, 희망을, 기쁨을 안기는 삶은 왜 지속되지 않을까.
두서없는 나그네의 상념으로 한 시간 남짓 걷다보니 세심정이다. 세심(洗心),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다 해도 상흔이 사라질 리 없다. 세조가 참회하며 걷던 길엔 영속적인 시간이 흐른다. 이 길은 세조의 유한한 생이 상처로 남았지만 생존중인 내게도 유한하다. 반환점이다.
이 지점은 추억이 가물거리고 미래는 기약 없는 지점, 세속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지점, 불가역의 생존영토로 돌아서야할 지점, 속리의 공간과 시간이 이쯤에서 멈췄으면 하는 지점. 상흔(傷痕)이 남더라도 세심(洗心)이 간절해지는 지점이다.
나는 언제나 생이라는 길 위에, 또 어느 순간 반환점에 있었다. 그 길 또한 매번 참회의 길이었다. 그래서 이 길이 아프다. 세조가 아프고 어린 단종이 아프다. 12살의 어린 단종이 사약을 받을 때 12살의 최치원은 당나라로 유학길을 떠났고 난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그때부터 얼마나 멀리 걸었던가. 정작 중요한 것은 참회 없이 사는 것, 이 세상의 진리가 그럴진대 세상살이는 후회와 회한이 그치질 않는다.
착시든 실수든 정당하든 모든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난 왜 내 곁의 동행자를 더 완전하게 채우지 못했던가· 건강하게,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더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그래서 이 삶이 꽉 차게 재미있고 충족되게, 더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못 만든 것일까·
최치원과 세조를 기억하는 나무그늘 아래로 난 터벅이며 내려간다. 도보로 왕복 2시간, 참회하는 '세조길'은 이제 갈무리된다.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언제쯤 나의 길(道)이 완성될 것인지 세조길이 묻는다. 속리를 벗어나니 곧 바로 세속, 속래(俗來)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