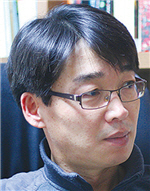
장정환
에세이스트
봄비는 겨울날의 잔기침을 삼키고 지난계절에 날아든 철새들의 풍경조차 은근슬쩍 잊게 했다. 금강의 물길을 날아오르던 그 많던 새들이 이제 어디로 갔는지 난 알지 못한다.
오늘 아침 난 미술평론가 '존 버거'의 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본다"를 떠올리며 봄을 본다.
영어의 봄 'spring'은 이쁜 말이다. 옹달샘 바위 틈새에서 퐁퐁 솟아나오는 물방울이 시원하다. 혹은 겨울동안의 긴 잠을 깬 개구리가 스프링처럼 튀어 오른다.
한자어 '춘(春)'은 또 얼마나 앙증맞은가. 간질거리는 봄 햇살에 화답하듯 뽕나무 새순이 자그마한 머리를 뾰족이 내민다.
우리말의 '봄'은 좀 더 철학적이고 관념적이다. '혼불'의 최명희는 말은 곧 '정신의 지문'이라고 했다. 봄의 어원을 살피면 수천 년간 우리민족이 품어온 생각의 그릇을 알 수 있다.
'보다'가 명사형이 되어 봄이 되었다. 혹자는 봄이 불(火)이 오는 형상이라 하고, 햇볕(陽)이 오는 구조라고도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추상화와 상상력이 한 수 위다.
난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봄이 '보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한 표를 던진다. 사람의 모든 감각과 동작을 시각화하는 경향이 우리말만큼 뚜렷한 언어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본다. 먹어보고, 입어보고, 들어보고, 만져보고, 맡아보고, 느껴본다. 생각까지도 '생각해 본다.' 어디 그뿐일까· 일을 보고, 장을 보고, 출산까지도 자손을 본다고 한다.
그러니 모든 것의 시초에는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고, 자연에 대한 최초의 관조가 '봄'이라는 것에도 나는 동의한다.
따뜻한 햇살을 받은 모든 초목이 생명을 움 틔우는 경이, 그것을 바라볼 때가 봄이다.
내게도 그런 깨달음의 순간은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들판에서 봄비를 만난 후 뒤돌아보면 3월의 화사한 햇살이 농담처럼 다가와 있었다.
난 눈이 순한 초식동물처럼 봄을 맞이했다. 무심한 짐승마냥 바라보는 봄은 어느새 한숨처럼 스쳐가고 봄꽃은 맥락 없이 피었다가 쉬이 져버릴 것이다.
간절함 없이 피어나는 봄꽃이 없듯이 설렘과 기다림을 잉태하지 않는 봄은 얼마나 즉물적일 것인가.
존 버거의 말처럼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하지만 보는 것은 사람각자의 의지적인 선택행위이다.
간절하게 보는 것과 무심히 보는 것은 다르다. 보려 한다고 해서 다 볼 수가 없고,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똑 같이 보이는 게 아니다. 안 보이는 것도 기다림과 설렘과 간절함만 있다면 심안으로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는 경치가 광경이라면, 내가 개입해서 시간과 상황을 편집하면 장면이 된다. 내가 보는 것들에 감정을 배제하면 풍경이고, 내 주관과 정서가 스며들면 정경이 된다.
한때 철새들이 노닐던 강변이 이제는 휑하니 비어있다. 이 계절을 새 풍광으로 채우고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봄이다.
난 이 투명한 봄날을 무심하게 통과시키지는 않겠다. 씨 뿌리는 기다림으로 나만의 장면을 만들고, 개화를 고대하는 설렘과 간절함으로 나만의 봄 정경을 가꾸고 싶다.
하지만 봄을 바라만 봐도 마구 들뜨니 도대체 이 봄을 어쩌면 좋으냐! 어쩌란 말이냐!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