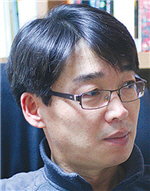
장정환
에세이스트
스물 일곱여덟 살쯤,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생활을 하던 때였다. 시사영어사에서 매달 발간하는 영어잡지의 번역대회에 당선되어 부상으로 받은 상품이었다.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영문을 번역하여 고치고 또 고치고, 수동타자기로 정성스레 글자를 쳐서 보낸 원고가 덜컥 그 잡지에 실렸다.
당선된 사람은 두 명, 두 개의 번역문을 국내 유수대학 영문과 교수가 원문과 대조하여 잘잘못을 지적하며 마구 메스질을 해대었다. 번역문의 내용은 지금은 잊었지만 심사평을 읽을 때 화끈거리던 내 얼굴이 지금도 기억난다.
당시 학생관련 기관에서 일한 탓에 심사위원은 나를 영어교사쯤으로 생각한 듯하다. 다른 한 명은 전문 번역가를 준비하는 대학원생쯤 되는 것 같았다.
같은 문장을 두고 두 개의 번역문을 대조해보니 신기하게도 글의 형식과 전달 의미가 많이 달랐다. 대학원생은 직독직해 위주의 정직한 번역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난 앞 뒤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한 의역의 과감성을 칭찬해 주었다. 무엇이 좋은 번역인지의 결론 없이 각자의 장단점을 피력했던 것 같다.
큰 아들이 대학생 때 들고 다니던 전공원서를 보고 무척 놀란 적이 있다. 나도 대학시절 영어 전공원서를 읽으며 공부했지만 내 사회과학원서는 아들 것과 비교하면 냄비받침 가량의 부피와 규모로 초라해 보일 정도였다.
아들의 원서는 목침을 두 개 겹쳐 놓은 정도의 부피, 아령 대용으로 사용해도 될 만한 무게의 책들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책의 내용이었다.
물리화학과 공학수학의 원서를 들쳐보다가 내 머리에 쥐가 났다. 수학도 어려운데 영어로 수학을 공부하다니, 물리와 화학공식으로 온통 채워진 원서는 내가 읽어볼 엄두도 못 낼 내용이었다.
그 때부터 공대생인 아들이 달리 보였다.(모든 공대생들이여, 공돌이라 놀리던 무식한 나를 용서하시라)
정작 내가 가장 어려워한 것은 영어 원문으로 소설을 읽는 거였다. 서머셋 모옴처럼 단정하고 깔끔한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만 있는 게 아니었다.
다의적인 형용사와 부사가 난무하고, 중첩되는 동사와, 도치문이 종횡무진 하는 소설을 원문으로 읽기란 내 실력으로는 언감생심 불가능하였다.(한글 책도 제대로 못 읽는 주제에)
그렇게 영어와의 내 인연은 종쳤다. 다만 예전 경험을 토대로 좋은 책이 나올 때면 번역자별로 책을 대조하며 읽게 되었다. 번역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다가오는 글의 맛과 뉘앙스를 알아채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어려운 책을 읽는 것과 같을 거라고 생각해 본다. 게다가 세상은 외계어로 쓰인 난해한 책일 것이다.
단서만 있고 해답은 없는 책, 저마다 독법이 다르고 사용하는 품사가 다른 책, 누구는 고정불변의 명사로, 혹은 살아 움직이는 동사로, 어떤 이는 풍요롭게 변용하는 형용사로 읽는 책, 누군가는 정치로 읽고, 예술로, 또는 물리와 화학으로도 읽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읽는 과정이 평생 오독인지도 또 모를 일이다. 모든 것을 아는 척 하는 인류가 우주에 대해 아는 지식이 고작 4%에 불과하다지 않는가.(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르지 아마)
아직 베일에 싸인 96%중에서 얼마나 더 많이 알아야 세상을 '이해'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목침만한 사전도, 목침 두 배만한 전공원서도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다. 난 그 사실만은 확실히 알고 있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