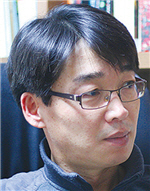
장정환
에세이스트
대입 재수공부를 핑계로 찾은 산사는 촛불로 밤을 밝혀야 했고, 주지스님과 공양을 챙기는 젊은 보살과 어린 아들, 떠돌이 객승만 있던 그야말로 단촐 하다 못해 적막강산이었다.
간첩이라니, 난 내가 사건의 중심에 있을 뻔한 사실에 흥분하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숨죽여 들었다.
산짐승도 잠든 깊은 밤, 쩌렁쩌렁 산이 커가는 소리만 간간이 들릴 때 깜빡 초저녁 곤한 잠이 들었던 젊은 보살은 건넌방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잠이 깨었다. 삐삐거리는 금속성의 소음은 여느 자연의 소리와는 달랐고 감각적으로 심상치 않은 소리임을 직감했다.
아기를 들쳐 업고 10리나 되는 어둡고 험한 산길을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면서 내려왔고 곧바로 군부대에 신고했다. 군인과 경찰들이 사찰을 에워싸고 확성기로 자수하라는 소리를 질렀을 때 엘리트 출신 간첩은 끝까지 저항하며 목을 자해하다 생포되었다.
35년 전의 일인데도 산사의 기억이 강렬한 것은 그곳에 평범하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로 난 몇 번 더 그 산사를 찾았다.
20대의 어느 겨울이었다. 다시 찾은 산사 입구의 풍경은 선명했다. 눈으로 뒤덮인 산길 초입의 민박집에선 굴뚝위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다. 하얀 눈밭에 점처럼 놓여있던 그 집은 수묵화의 배경처럼 고적했으나 군불로 데워진 아랫목이 금세 연상될 만큼 훈기가 느껴졌다.
따끈따끈한 온돌방에서 밤을 보낸 뒤 창호지 문을 열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간결한 여백의 풍경, 개울물의 얼음을 깨서 세수를 한 후 먹었던 고봉밥상의 산나물무침, 그 모든 눈 내린 풍경과 아침내음이 지금도 또렷하다. 그 때 난 산사는 오르지 않고 입구만 맴돌다 되돌아왔었다.
예전에 떠돌이 스님이 내게 한 말 때문이었다. "젊은 친구, 잿빛을 동경하지 말게, 나도 자네처럼 젊을 때 이 잿빛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땡중이 되었네, 며칠 쉬다가 내려가게나." 그 때 그 말이 내 뇌리를 맴돌았고 스님의 말을 꼭 들어야만 될 것 같은 위엄이 내 발길을 돌리게 했던 것이다.
그 후로 십년쯤 지나 가족들과 함께 인근에서 온천을 하고 산사를 다시 찾았다. 그 사이 오솔길밖에 없던 길은 산 중턱을 헤집어 임도를 놓았고, 커다란 주차장이 생겼고, 전기불이 들어왔고, 안팎으로 산바람이 넘나들던 창호지 문들이 커다란 유리문으로 바뀌었다. 전의 주지스님은 큰 절의 주지로 자리를 옮겼고, 젊은 보살은 간첩신고 보상금으로 질박한 인생을 접고 어린 아들과 함께 이미 절을 떠났다.
젊은 한 때, 수만 광년 전의 별빛이 산중턱의 내게 쏟아져 내릴 때 난 언제나 이곳을 그리워하며 살 수밖에 없으리라 여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순박한 산사도, 한 때 순수하던 나의 청춘도 속세의 때로 변색되었다. 난 산의 오솔길을 내려오면서 실로 착잡한 마음으로 산사의 곡절과 삶의 변절을 헤아리고 수긍하려 했다.
난 그로부터 오랫동안 산사를 잊고 살았으나 그 산사의 아침햇살, 바람내음, 새소리, 계곡물, 밤에 일렁이던 촛불의 불꽃만은 내내 그리웠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