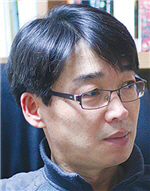
장정환
에세이스트
빨간색 기차, V-트레인을 타고 왔다. 중부내륙순환열차를 거쳐 경북의 최북단 봉화, 그 봉화의 최북단 분천역에서 이 협곡열차는 출발했다.
겨울이 시작하는 차창 밖으로 서서히 낙동강으로 내지르는 협곡이 깊어졌다. 계곡의 깊이만으로도 육중하게 흘렀을 여름의 물줄기가 가늠된다.
고속열차의 딱 10분의 1의 속도로 1시간 정도 달리는 열차, 중간에 양원이나, 승부역 등 두어 평 남짓한 간이역에 정차하는 기차는, 가 닿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아득한 순간, 쓸쓸하지만 따스한 미소를 짓게 하던 추억, 그 시간 속에서 가슴 저리게 하던 사람들을 그립게 한다.
탄광촌, 막장 인생들이 마지막으로 닿는 곳, 우리가 아는 막연한 지식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60년, 70년대만 해도 3만 명 이상의 인구가 북적이던 철암은 부나방처럼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검은 황금'을 캐기 위한 젊은이들이 매일 넘쳐 났고 돈은 흥청대었다.
대졸 초임이 5만원 하던 때 광부의 월급은 20만원 하던 시절이었다. 한 시대, 한 국가의 경제를 견인하던 석탄 산업은 이제 그 흔적만 전시되어 있다.
난 그 거리를 걸었다. 젊은 시절 지하 수백 미터 갱에서 석탄을 캐던 늙은 광부는 홀로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마셨고 나도 순대국과 막걸리를 시켰다. 지금도 가동하고 있는 선탄장 앞에서 흑백사진을 찍고 난 후였다.
지나가는 풍경에서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는 축복이다. 초로의 광부와 금방 친해진 내 동료 신과장은 그 어르신과 열띤 대화중이다. 난 그 친구의 그런 점이 좋다. 사람에게 다가갈 줄 알고, 연민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이다.
내 고향 문경도 탄광촌이었다. 그곳에서 그나마 지식인으로 통하던 내 아버지는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이들을 위해 가끔씩 안동에 있는 노동부 사무소를 다녀왔다.
그 날마다 아버지는 술을 한잔 드시고는 나를 불렀다. "얘야, 이 사람들이 비록 막장 인생 같지만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단다. 그들은 겸손하게 살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골목 가득히 웃고 있는 저 아이들의 아버지들이다."
거의 50년이 되어가지만 그 말만은 또렷하게 기억되니 신기할 따름이다. 난 시를 쓰는 광부를 알지 못하지만 광부의 딸로 살아왔던 한 시인은 안다. 난 그 시인의 정제된 보석 같던 시어들을 좋아했다. 한 때는 그 시들을 아침마다 읊조리곤 했었다.
수 백 미터 지하 갱도에 유배당한 것처럼 암담했을 사람들,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만 더 높이 치솟고 싶던 사람들, 해맑게 웃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진창으로 빠지는 노동을 견뎌낸 사람들, 땅속의 캄캄한 시간을 빛으로 여겼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어디로 떠난 것일까.
이 세상의 경계마다 막장 아닌 삶이 어디 있으랴. 사람이 떠난 곳이 막장이며 사람의 온기를 잃은 곳이 막장인 것을.
행여 삶이 외롭거나 고달프다고 여겨질 때면 이곳의 간이역을 서성여보고 무채색의 철암에 가 볼일이다. 이곳을 떠난 광부의 딸은 지금도 보석 같은 시를 쓰고, 광부의 아들은 그의 아들을 위해 또 다른 무지개빛 꿈을 꾼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