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현두
시인·괴산문인협회장
나는 이 감나무를 보면 시인 김영랑의 시 「오메 단풍 들것네」가 생각나 감나무 이름을 '오메'라 지었다. 오메는 처음에는 감이 애기 주먹만 하더니 몇 년 지나서부터는 아이들 주먹만 하게 굵어졌다. 첫해에 까치가 쪼아 먹고 남은 조막만 하게 홍시가 된 감을 처음 맛보았는데 그 맛은 내가 이제까지 전혀 느껴보지 못한 감맛이었다. 꿀맛도 아니고 설탕 맛도 아닌 감 고유의 달큼한 맛, 아 단맛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탄복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맛이었다.
지금도 그 감맛은 변함이 없다. 너무 달아선지 조금만 누렇게 익을라치면 까치가 달려들어 먼저 시식한다. 감이 어찌나 연한지 벌레와 잡균들이 쉽게 침투해서 감이 홍시가 될 때까지 나무에 오래 달려 있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고 만다. 좀 더 오래 달려 있어 천천히 익어 가면 짙은 녹색으로 빤짝이는 감잎 사이사이로 빨간 감을 보는 행복감을 느낄 텐데 아쉽다.
오메는 올해 유난히도 감이 굵었는데 오며가며 자연스레 관찰하다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감색이 초록색일 때 자기가 달고 있는 감의 절반 정도를 며칠사이에 떨어트렸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열매의 개수를 스스로 줄여 버린 것이다. 스스로의 능력을 알고 제어해 나가는 나무, 인간보다 못한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본다.
나무는 대개 수십 년 이상을 산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나무는 건강하게 체력을 유지하며 후손을 이어가는 지혜를 키워왔다.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 사는 나무는 추운 겨울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다. 그래서 햇빛 좋고 비가 많이 오는 봄, 여름에 광합성을 최대한 많이 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몸집을 키운다. 가을에는 추운 겨울 건널 준비를 착착 진행한다. 우선 광합성 작용의 일등 공신이었던 잎이 이제는 걸림돌이 된다.
만약에 겨울까지 잎을 그대로 달고 있다면 적은 햇빛과 적은 수분, 낮은 온도 때문에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때문에 목숨까지 부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나무는 알아차리고 결단을 내린다. 그래서 광합성의 공장이었던 잎을 과감히 떨어트리기 위해 잎자루 끝에 '떨켜'란 차단막을 만든다. 이 떨켜층이 형성되면 나무는 뿌리와 몸체로 부터 수분과 영양의 공급을 차단하게 되고 그 결과로 잎은 말라 떨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잎의 푸른색을 내던 엽록소가 분해되어 빨강 주황 노랑 등의 색소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은 낙엽이다. 이렇게 겨울을 건너온 나무는 따뜻한 봄이 오면 연둣빛 새잎을 내고 잎은 녹색으로 짙어지고 활발한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축적해서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한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어찌 그리 정교한 생존의 지혜를 쌓았을까.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일까. 인간은 나무에게서 자연에게서 배울 점은 없을까. 벌써 감을 다 떨어뜨리고 가을채비를 마친 감나무 아래서 나는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1

정부·여당 vs 야당, '尹탄핵심판' 길어지며 사안마다 충돌
-
2

충북 소비자 지갑 꽉 닫혔다
-
3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청주시도시공사 전환 본격화
-
4

충북보건과학대, 반려동물 전문 시설 '펫파크' 조성
-
5

'3명 사망' 청주 수곡동 4중 추돌 사고 운전자 급발진 주장
-
6

충북 3개 국립공원 탐방로 전면 또는 부분 통제
-
7

충주 남한강초 운영위, 심항산 환경정화 및 워크숍 실시
-
8

충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논쟁 '도마 위'
-
9

"64회 충북도민체전 준비 만반" 대표자회의 성료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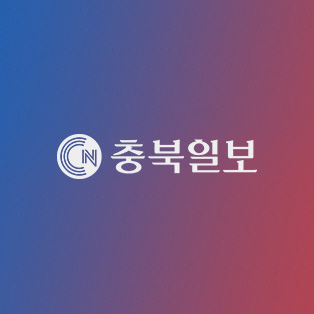
청주 용화사 무심천 벚꽃축제 '2025 나누는 인연! 벚꽃과 함께' 개최

















